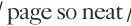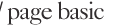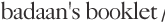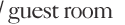땅의 옹호 (김종철 평론집, 녹색평론사)
- 농업문명이 발전하여 근대산업문명이 이룩되었다.
- 경제성장과 개발을 통해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주의를 실현되기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자본주의의 악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농업중심사회로는 문명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 근대산업문명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성숙, 세계의 평화는 비례관계에 있다.
근대화교육을 받고 근대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가치를 욕망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 명제들이다. 1차산업 농업, 2차산업 공업을 거쳐 3차산업인 서비스업 단계의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를 자랑스러워하도록 교육받았으니 이런 선형적인 역사인식과 근대주의적인 발전사관을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었던 것도 당연하다.
수십년간 인간과 환경문제에 천착해 온 저자는 이 책의 전반에 걸쳐 이 명제들이 얼마나 허망한 믿음인지 보여준다. 인류는 원시적인 농업문명에서 산업문명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화, 근대화가 본질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는 타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인해 농(農)의 세계와 가치, 그리고 그에 기반한 공동체가 붕괴되었음을 이야기한다. 폭력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성장과 발전의 논리 -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 닥친 생태적 위기, 심화되는 빈부격차, 위협받는 민중의 평화 등 인류공통의 난제들은 '우정', '환대'의 가치를 되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는 오직 자치와 자율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와 그에 기반을 둔 농적 순환사회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 강조한다.
그 연륜만큼이나 넓고 깊은 지적토대를 갖춘 저자는 일찍이 산업화 자체의 내재적 악을 꿰뚫어 본 간디의 혜안과 '우정'과 '환대'라는 철저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보살핌의 미덕을 강조하는 철학자 이반 일리치의 사상을 깊이있게 소개한다. 사회의 부조리에 절망하고 선형적인 발전사관의 덫에 걸려 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땅의 옹호'는 인문학으로 인도하는 멋진 입문서가 되었다.
작지 않은 깨달음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환대(hospitality)' 에 관한 이야기.